 |
|
마타 하리는 독일에 정보를 줬다며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프랑스 정보국은 정작 법정에는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언론은 그의 억울함보다는 섹스, 매춘부 등 가십거리 보도에만 열을 올렸다. <한겨레> 자료사진 |
[토요판] 정문태의 제3의 눈
(19) 세계의 간첩 조작
“반군이란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
나라 안팎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마다 내 친구 밤방 하리무르티가 했던 말이 떠오르곤 한다. 반군과 간첩이라, 얼핏 둘 사이에 맞닿는 게 없을 듯하니 사연을 좀 따져보자. 2003년 5월1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을 외쳐온 자유아체운동(GAM)을 박멸하겠다며 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인 적이 있다. 군은 그 작전에 앞서 신문과 방송 편집장들을 밀실에 모아놓고 ‘민족언론’ ‘애국언론’을 들이대며 으름장을 놨다. 주눅 든 모든 언론사들은 군사작전 첫날부터 1면에 아체 반군 희생자 사진을 깔고는 정부군 승전보를 울려댔다. 4일 만인 5월23일 일이 터졌다. 아시아 언론자유투쟁 대표선수 격인 템포그룹은 일간 <코란 템포>에 대문짝만하게 ‘정부군, 시민 7명 사살’이란 제목을 달아 올렸다. 같은 날 다른 언론사들은 일제히 ‘정부군, 반군 7명 사살’로 제목을 뽑았다. 정부와 군은 난리가 났다. 그날 템포그룹 총괄편집장인 밤방은 “13살짜리 아이를 포함한 희생자 7명이 반군이란 증거가 없다.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라고 되받았다. 밤방의 그 한마디와 <템포>의 저항은 ‘군-언 동침’을 깨우는 날카로운 자명종 노릇을 했다. 그로부터 인도네시아 시민들 사이에 “반군이라서 사살당한 게 아니라, 사살당하면 반군이 된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코드명 H-21이 마타 하리라고?
프랑스 정보국의 유일한 증거는
화장용 도구라 밝힌 비밀잉크뿐
결국 그는 안대와 포박 거부한 채
1917년 10월 총살형으로 최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영토분쟁
타이 간첩과 캄보디아 간첩 속출
술 마시고 지도 들고 국경 근처를
어슬렁대면 간첩이 될 수 있었다
외국관광객이라면 조심할 것!
“체포 순간 나체” 따위에만 관심 가진 언론
여기서 반군을 간첩으로 바꿔보자. 이 세상 모든 간첩 조작사를 훑어보면 어김없이 미친 언론이 등장한다. 그게 권력에 빌붙었든, 장삿속이든, 빨갱이 히스테리든, 이도 저도 아니면 부화뇌동이든 언론은 반드시 간첩몰이에 조연 노릇을 한다. 정보기관이 간첩 체포란 말만 슬쩍 흘려 놓으면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실과 상관없이 조기 확인사살을 해주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간첩 만들기는 그렇게 쉬웠다. 그러니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간첩을 만들어 왔고 시민은 희한하게도 늘 때맞춰 잡히는 간첩을 보아왔다.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내지를 줄 아는 언론이 흔치 않았던 탓이다. 현대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이름난 두 간첩조작 사건들과 만난다. 하나는 드레퓌스(Alfred Dreyfus)고 또 하나는 마타 하리(Mata Hari)다. 그 두 사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극우 민족주의가 판치던 유럽 사회에서 태어났다. 1894년 프랑스 포병 대위 드레퓌스는 군 정보부가 독일대사관 우편함에서 발견한 비밀 문건의 작성자 코드네임 ‘D’와 오직 이름 첫 자가 같다는 이유 하나로 체포당해 비전문 필적 감정사가 말한 ‘닮은 필체’라는 유일한 증거 하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반유대인 정서를 퍼뜨려온 <라 리브르 파롤>(La Libre Parole), <레클레르>(L’Eclair>,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 <라 파트리>(La Patrie) 같은 극우 매체들은 유대계 드레퓌스를 ‘출생을 배신한 매국노’로 몰며 단죄를 외쳤다. 2년 뒤,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몰았던 페르디낭 에스테라지 소령이란 자가 진짜 간첩으로 드러나면서 드레퓌스건 재심을 놓고 프랑스 사회는 반드레퓌스(반유대 민족주의, 가톨릭, 군부)와 친드레퓌스(일부 공화파와 사회주의 지식인)로 갈려 세차게 부딪쳤다. 군부가 드레퓌스 무죄 요구를 묵살하는 가운데 다시 극우 언론들이 앞장서 재판을 반대하는 광기를 뿜어댔다. 바로 그때 문학신문 <로로르>(L’Aurore)를 통해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에밀 졸라의 유명한 공개편지가 등장했고 아나톨 프랑스 같은 작가와 장 조레스를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거들고 나서면서 결국 드레퓌스는 1906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현역 군인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5년 대통령 자크 시라크가 드레퓌스의 무죄를 공식 인정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드레퓌스가 프랑스 정부와 군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기 까지는 그렇게 꼭 100년이 걸렸다. 마타 하리는 간첩조작 사건 희생자라는 본질은 같지만 과정과 결과는 드레퓌스와 달랐다. 마르하레타 헤이르트라위다 젤러(Magaretha Geertruida Zelle)는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첩이다. 왜? 여자고 춤꾼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언론이 예나 이제나 그이를 ‘섹스’, ‘이중간첩’, ‘매춘부’ 같은 얍삽한 이야깃거리로만 덧칠해 온 탓이다. 빼어난 미모에다 그 시절엔 파격적이었던 반나체춤으로 유럽을 휩쓸었던 마타 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달아오르던 1917년 2월 독일에 정보를 흘린 간첩 혐의로 프랑스 정보국에 체포당했다. 그동안 마타 하리의 걸음마다 열광하며 가십으로 따라붙었던 언론들은 그이의 체포 순간마저 나체였는지 아니었는지 따위에만 눈길을 쏟았다. 프랑스 정보국은 영국 정보국(MO5)이 독일과 스페인 사이의 라디오 교신을 도청해서 얻은 코드네임 H-21이 마타 하리라며 체포했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단 한건의 문서도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프랑스 정보국이 내민 유일한 증거는 마타 하리가 화장용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던 비밀잉크가 다였다. 그 과정에서 마티 하리의 변호사는 검찰이 내세운 증인을 심문할 수도 없고 마타 하리를 위한 증인도 세울 수 없는 불법 재판을 받았으나 어떤 언론도 의문을 달아주지 않았다. <랭트랑시장>(L’Intransigeant), <르탕>(Le Temps)을 비롯한 극우 언론들은 기꺼이 한 여인을 몸 파는 이중간첩으로 몰아붙였다. 남자고 군인인 드레퓌스에겐 있었던 ‘에밀 졸라들’도 마타 하리에겐 없었다. 그해 10월 안대와 포박을 거부한 채 마타 하리는 총살형으로 삶을 마감했다.
결국 전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한 에설
마타 하리가 죽임 당하고 30년이 지난 뒤에야 당시 마타 하리를 기소했던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고백했다. 1999년 영국 정보국(MI5)은 “마타 하리가 독일군에게 군사정보를 넘긴 사실을 자백했다는 프랑스 정보국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타 하리 간첩조작 사건은 그 시절 영국과 프랑스 정보 당국의 합작품이었다는 뜻이다. 시대와 화합하지 못했던 마타 하리를 간첩으로 몰아 살해한 공범은 선입견과 질투심에 짓눌린 사내들이었고 섹스를 팔아온 매춘언론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소비에트연방에 핵무기 정보를 넘긴 간첩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온다. 이름 하여 아토믹 스파이(Atomic Spies)란 별명을 단 사건들이었다. 돋보이는 것들만 따져도 10건이 넘는 그 간첩 사건들 가운데 몇몇은 여전히 음모와 조작설로 말썽을 빚고 있다. 좋은 본보기가 에설 로젠버그(Ethel Rosenberg)였다. 매카시즘 광기에다 한국전쟁까지 겹친 1950년 에설은 남편 줄리어스와 함께 핵폭탄 정보를 소비에트에 넘긴 혐의로 체포당했다. 그러나 에설은 재판에서부터 큰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들이댄 증거란 게 핵폭탄 정보를 빼내 줄리어스에게 준 에설의 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라스가 “에설이 그 자료를 타이핑하는 걸 보았다”는 증언이 다였다. 1951년 판사 어빙 카우프먼은 끝끝내 간첩 혐의를 부정했던 에설과 줄리어스에게 간첩죄뿐 아니라 당치도 않는 한국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 간첩 사건으로 함께 체포당했던 데이비드를 비롯한 모든 이들은 자백 대가로 9년~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 할 것 없이 모든 미국 언론은 그 정치적인 간첩조작 사건을 놓고 정부를 따라 반공만 죽어라 외쳐댔다. 결국 미국 언론 대신 국제사회가 들고일어났다. 장 폴 사르트르, 장 콕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과 교황까지 나서 에설의 무죄석방 운동을 벌였다. 오히려 <뉴욕 타임스>는 1953년 ‘로젠버그를 이용해 미국을 증오로 몰아가다’는 제목 아래 공산주의 언론들이 친로젠버그 운동을 벌인다며 국제사회를 비난했다. 1953년 6월 에설과 줄리어스는 전기의자에서 삶을 마쳤다. 이 부부는 냉전 기간에 미국 시민 가운데 간첩죄로 사형당한 유일한 경우였다. 세월이 흘러 데이비드를 비롯한 그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둘씩 에설의 무죄를 고백했다. 그렇게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가 된 에설은 이미 60년 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뒤였다. 그로부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신문과 방송들이 에설 간첩조작 사건을 경쟁적으로 다뤄왔다.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살해한 공범인 그 미국 언론들이 이제 와서 진실을 떠들어대지만 용서를 빈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타이-캄보디아, 서로 간첩조작 했다며 삿대질
간첩조작 사건은 아시아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몇 해 전 타이와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낀 영토분쟁을 벌이던 가운데 느닷없는 간첩 사건이 튀어나왔다. 2010년 12월29일 캄보디아 정부는 타이 극우민족주의 시위대가 국경을 침범했다며 전 하원의원 파닛 위낏셋을 비롯한 7명을 체포했다. 그 가운데 위라 솜쾀킷을 비롯한 2명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이자들의 국경선 시위는 수많은 기자들이 쫓았고 이미 타이와 캄보디아 두 정부에서는 사전에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기자들을 달고 다니는 간첩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해준 사건이었다. 맞선 타이 정부는 2011년 6월9일 캄보디아인 웅킴따이를 비롯해 베트남과 타이 시민 셋을 프레아 비헤이르를 낀 국경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타이 정부는 총리까지 나서 간첩 증거라며 “그 셋이 타이 국경 군사지역을 돌아다녔고 지도를 지녔다”고 밝혔다. 총리는 그자들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싶었던지 “그 간첩들이 술 취하고 마약을 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타이 정부는 일주일쯤 뒤 캄보디아 간첩이 도망쳤다고 밝혀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술 마시고 지도 들고 국경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간첩이 되고 마는 세상이다. 외국 관광객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그 과정에서 두 정부는 서로 간첩조작 사건이라며 상대를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해댔다. 그랬다. 누가 봐도 그건 터무니없는 간첩조작 코미디였다. 근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내세운 타이와 캄보디아 언론은 서로 상대 정부만을 나무라고 타박했을 뿐 자기 정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참 나쁜 언론들이었다. 이렇듯 시대와 국가를 넘어 그 모든 간첩조작 사건에는 반드시 언론의 광기가 배역으로 등장했다. 그 많은 시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희생당하는 동안 “증거 없으면 시민이다” 이 한마디를 외쳐줄 줄 아는 언론이 우리 곁에 없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어땠는가? 언론이 천사를 불러올 수 없다면 악마의 출현이라도 막아야 옳지 않겠는가? 다시, 언론이 대답할 차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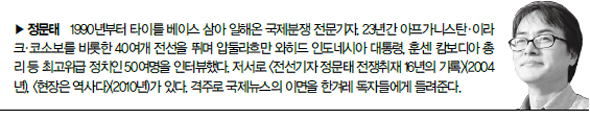 |